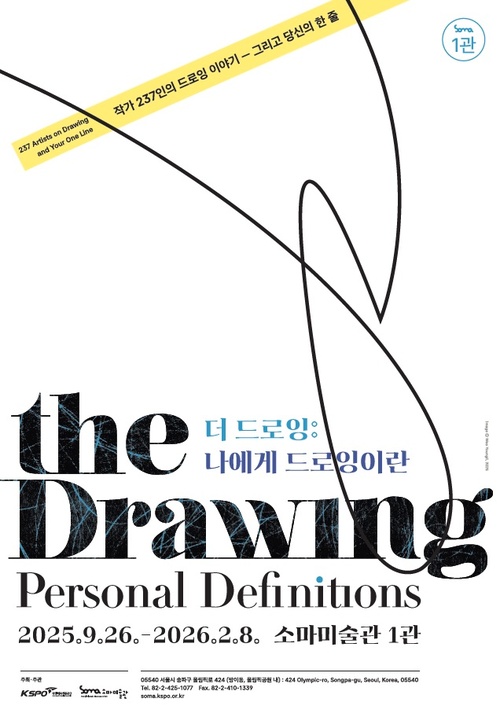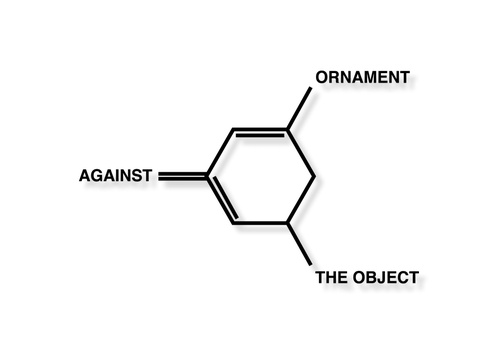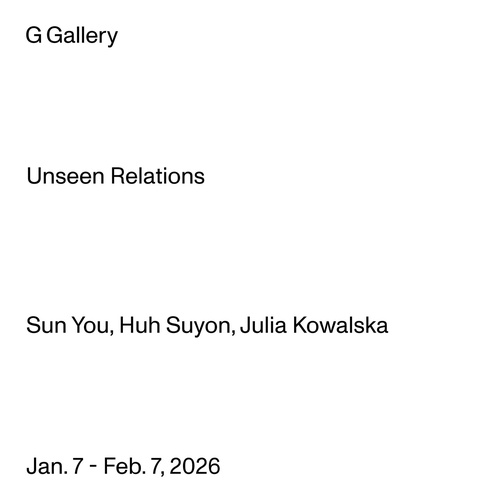남석우, 이시현: 핑 Ping
갤러리기체
2026년 1월 30일 ~ 2026년 2월 28일
핑*은 비어 있는 신호다. 의미를 주고받기에 앞서 의미가 오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원적이고 선험적인 두드림이다. 갤러리 기체는 2026년 첫 기획전으로 남석우, 이시현의 2인전 《핑》(Ping)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거나 주장하기보다, 세계와의 열린 관계라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행위로서 회화에 주목한다. 핑이 은유하는 것은 이를테면 의미의 생산이 아니라 의미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정성 자체를 작업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적 태도일 것이다.
남석우의 회화는 눈앞의 대상보다는 내면의 상에서 출발한다. 작가가 의미를 두는 것은 관념 속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끊임없이 뒤집어 보고 진흙처럼 매만지는 촉각적 과정 자체이다. 중세 유럽의 신비극 무대나 불 꺼진 고가구점 같은 생경한 공간에서 알 수 없는 힘과 사투하는 비현실적 존재들은 대상이 놓인 조건과 그것이 대상에 가하는 소리 없는 압박을 의식하게 한다. 〈루프〉에서부터 〈씨름〉까지 남석우의 화면에서 거듭해서 등장하는 이른바 우로보로스 형상은 매번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무는 쪽과 물리는 쪽이 언제나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관계가 성립되는 방식보다는 일체의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의 긴장을 지속시키는데 작가의 관심이 있음을 암시한다. 악기인 것과 악기 아닌 것의 경계에 있는 〈다룰 수 있는 악기〉(2026) 속 오브제가 멜로디를 생산하는 도구라기보다 외부와의 소통 가능성을 가늠하는 매개로 도입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시현은 색과 면의 분절을 통해 인간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층위를 시각화한다. 캔버스에 나타나는 추상적 형태들은 일상 공간에서 추출한 것이지만, 이는 형태를 재현하거나 조형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작가는 공간을 이루고 있는 공기층, 관계와 사건의 잔향, 사회적 리듬 등이 의식의 문턱에 이르기 전 감각의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에 주목한다. 요컨대 이시현의 회화는 ‘보는’ 행위에 품겨져 있는 비의식적 (non-conscious) 국면을 탐색하는 것이다. 추상성을 가미한 풍경화처럼 보이는 〈아마〉는 외부 세계에 감응하며 끊임없이 재배치되는 지각의 짜임새를 드러내는 일종의 도면에 가까우며, 화면 중앙의 소실점을 향해 수렴하는 〈다경〉의 선과 면들은 원근법의 적용이 아니라 사물과 사건, 관계들이 머물다 간 흔적을 따라 정동이 배열되고 조직되는 방식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유화의 표면 위로 지나간 흑연의 선이나 사포로 비빈 마모 자국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조형적 요소라기보다 지각이 작동하며 남긴 물리적 각인으로 읽힌다.
두 작가에게 캔버스는 세상을 재현하는 창이라기보다 세상이 돌려보내는 신호를 받는 반사판에 비유될 법하다. 이는 어떤 개입이나 주장, 혹은 해석을 행하기에 앞서, 일단 ‘거기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일종의 출발선 긋기와 같다. 무엇을 말하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세계 사이에 회선이 놓일 수 있을 것인가 체크하는 성실한 안부 확인, 여기에 핑의 울림이 있다.
* 일정한 크기를 가진 의미 없는 자료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내 되돌아오는 상태를 보고 회선 상태를 관찰하는 명령어.
참여작가: 남석우, 이시현
출처: 갤러리기체
* 아트바바에 등록된 모든 이미지와 글의 저작권은 각 작가와 필자에게 있습니다.